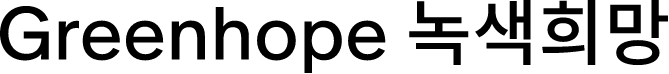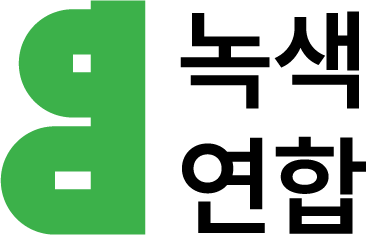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서귀포 범섬 바다에서 산호 기록중
파란은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6명의 탐사대원들과 함께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14곳을 탐사하였습니다. 제주도 본섬과 섬 안의 섬을 종횡무진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잘피와 해조류, 연산호와 남방큰돌고래를 만났고 미역의 실종 소식을 들었으며, 바닷속과 해안에서 쓰레기를 마주했습니다.
불(화산)과 물(바다)의 조화로 형성된 성산일출봉과 보호가 필요한 공간임에도 정작 도립 공원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난개발된 섭지코지, 인구 1,600명의 작은 섬에 한 해 관광객이 160만 명에 달하지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 중인 우도, 드물게 주민들의 신청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유지로 인해 지정 면적이 아쉬웠던 오조리, 엄청난 탄소 저장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천연 잘피 군락지 토끼섬, 세계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주민 의견이 갈린 추자도, 그리고 추자도 연안의 슴새와 상괭이, 천연잘피와 해조류,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연산호 군락 훼손이 이슈가 되었던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되었지만 ‘이용’에 치중된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미역이 실종되고 해안사구가 사라지고 있는 마라도, 올 여름 6주 연속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녹아내린 제주 연안 연산호, 복합 화산체가 빚어낸 다양한 암석과 지형으로 감탄을 자아냈지만, 잔뜩 쌓인 해양쓰레기로 탄식하게 된 차귀도까지. 어느새 탐사를 마치자 시작 무렵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주의 바다, 지층,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천연보호구역 차귀도 해변에 쌓여있는 쓰레기
위기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15배 가량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숙제가 있지요. 하지만 지정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문서상의 보호구역, 즉 ‘페이퍼 파크(paper-park)’로만 남을 것입니다.
인간만의 장소로 소비되어 온 바다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파란은 탐사대가 기록한 해양보호구역 현장의 모습을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시민과학자들과 바다를 기록하며,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파란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바다에서 만나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
◊ 활동가 한마디
바다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달이 차오르고 이지러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달빛을 받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상력과 용기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