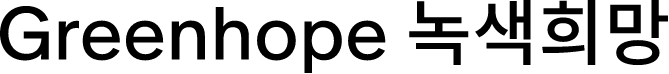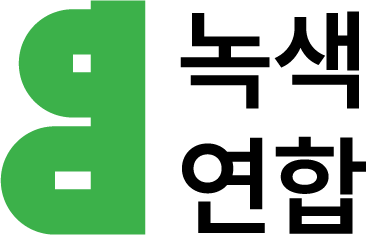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서식지 보전 및 생명권 보장]

어디로 가야 하죠
길의 다양한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숲길, 논두렁, 오솔길, 물길을 통해 다양한 생명들이 지나가겠지요. 언제부터일까요? 이제 ‘길’은 인간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한정되어 버렸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시설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은 야생동물들의 이동 속도도, 사람들의 걷는 속도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들의 이동시설로 생각되고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추가적인 도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는 하천 위, 강 위, 산을 뚫고 만든 터널 위조차 자동차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속도에 밀려 사람도, 뭇 생명들도 건널 수 없는 위험한 길의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그 위험천만한 길 위에 섭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짝을 찾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딘가로 이동하지만 목숨을 걸고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도로 위에 말이지요.
매해 봄, 상춘객들이 섬진강 인근 매화꽃을 보러 광양을 찾습니다. 매화가 필 즈음이면 섬진강 매화로 도로 위에 승용차나 대형 버스들이 주인이 됩니다. 이때 작은 웅덩이나 습지에 두꺼비들이 겨울잠에서 깨어 자신들이 태어난 습지로 돌아와 산란합니다. 회귀성 동물인 두꺼비는 태어난 지 3~4년 후, 다음 생명을 잇기 위해 자신들이 태어난 습지를 찾고 짝짓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습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흙으로 매립되면 두꺼비들은 산란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도로 위에서, 길 위에서 로드킬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 내리는 어느 밤, 제겐 우연히 그 도로를 지나다 산개구리와 두꺼비들을 로드킬로 죽게 한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돌멩이를 안고 지내는 것처럼 앓다가 2015년부터 찻길 사고로 죽는 양서류들을 조사하면서 양서류들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산란 시기에는 직접 이동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섬진강 인근 52곳의 저수지나 습지를 조사해 13곳의 두꺼비 산란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그중 지난 5년 동안 7개의 산란지가 건물 개발과 매립 등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6개의 산란지만 남았습니다. 섬진강 강가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하나의 산란지마저, 인근 건물이 개발되면서 습지가 훼손되어 두꺼비들의 산란이 3년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끼 두꺼비 이동 돕기
4년 전, 산으로 이동했던 어린 두꺼비들이 성체가 되어 다압면사무소 앞 산란지를 찾아줄 텐데, 대부분 매립되고 훼손된 산란지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아찔합니다. 산란지를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에 전남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분주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의 물길을 열어주고, 습지의 본모습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두꺼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 활동가 한마디
시민의 힘으로 두꺼비의 서식지를 돌려주고자 서식지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두꺼비가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음 생명을 잇도록, 그들이 지나는 길 위에서 더는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전남녹색연합은 2025년 생명의 편에서 단단히 서 있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