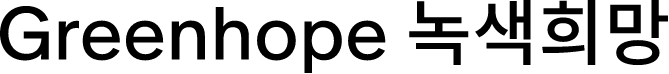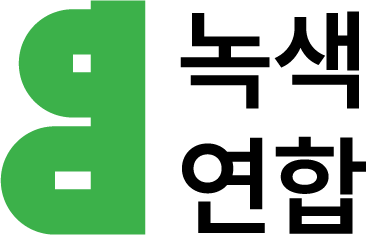질문 : 🐦⬛ 야생 조류와 가까워지는 버드피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걸까요? 법이나 시행규칙은 어떤가요?
지난 275호 녹색 희망한 편에서도 소개했듯이, 도심에서 쉽게 만나는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비둘기뿐만 아니라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등이나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또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 1. 24)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새로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유해 야생 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공원이나 거리 곳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들은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한편, 위 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24일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적으로 비둘기나 까치,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령을 통해서 금지하게 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 사이에도 규칙과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하듯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큰 피해와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고,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떤 정도의 공간적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밀집도를 형성하는 조류들에게까지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본 법률의 문구만으로는 예상이 어렵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들이 점차 마련되기 시작하면 주변 새들에게 먹이를 나누는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도 같습니다.
특히 집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은 법률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깊이 자리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들의 비둘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무서워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보니 비둘기야말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평화의 상징으로 활약하다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부터 비둘기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비둘기를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동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률상의 ‘유해생물’, ‘유해동물’은 오롯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한 것으로 이름 붙여진 생명들입니다. 건물을 부식시키고,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고, 군 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새들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전부 쫓아내야만 하고, 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개체수를 줄여야만 한다는 식의 접근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생명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반성 없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새들은 원래부터 살아오던 공간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요. 어쩌면 이러다가 집 앞에서 쉬고 있는 비둘기를 보기 어렵게 되는 것도 멀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이수빈 전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