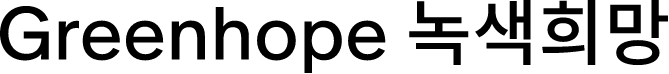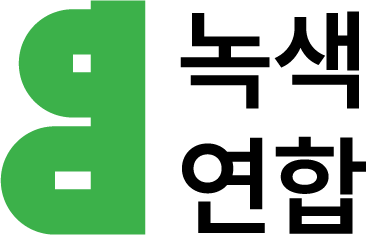가장 많은 닭이 죽는 달, 7월
7월 16일, 7월 26일, 8월 15일. 세 날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2022년 복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중에서도 특히 무덥다는 삼복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전통적으로 보양식을 챙겨 먹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나이만큼의 초, 중, 말복을 거쳐 가는 동안 제게는 복날이 지금도 괴로운 기억이 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단체 급식소를 가득 채운 수백 마리의 ‘헐벗은 닭’이었습니다. 당시 영양사 선생님은 직원들의 보신을 위해 정성껏 닭요리를 준비해주셨습니다만, 이때 저는 닭고기와 달걀의 생산과정을 알게 된 직후였기에 닭이 고기가 아닌 죽은 동물로 다가왔습니다. 건물을 뛰쳐나온 뒤에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던 목 없는 닭의 모습과 코를 찌르던 냄새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더 뜨거워진 올해, 여지없이 그날의 기억과 함께 복날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중복 전날인 25일, ‘복날’로 키워드를 조회해보았습니다. N사 기준 월간 연관 키워드가 삼계탕 501,600건, 백숙 151,370건, 추어탕 81,280건. 역시나 닭과 관련된 요리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양식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곧 보양식을 위한 생명들의 죽음도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날이 있는 매년 7월은 가장 많은 수의 닭이 죽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수는 어떨까 찾아보다, 작년 한 달에만 1억 564만 7천 마리의 닭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근 5년간 육계 도축 현황(출처-한국육계협회,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는 약 2만 2천 명, 사망자는 약 2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무려 7월, 한 달간 도축되는 닭만 1억 마리라니. 수십, 수백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대한 숫자를 마주하니 언뜻 가늠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총인구 수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이 많은 닭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식탁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이번 ‘비건이건 아니건’에서는 복날에 희생되는 닭을 기리며 통계를 넘어 농장 동물로써의 닭의 일생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① 고기로 태어난 닭의 일생
가축이 된 닭은 그간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위해 용도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되어 품종 개량돼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닭 본래의 이름은 잃고, ‘달걀을 낳는 닭(산란계)’과 ‘고기용 닭(육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닭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거치는데 가장 먼저 원종계라고 불리는 조부모 격의 병아리가 해외에서 100% 수입됩니다.
수입된 원종계는 국내에서 마리당 약 40~50마리의 종계를 낳는 역할을 합니다. 종계는 ‘번식을 위한 닭’이자 식탁에 오르는 닭과 달걀의 부모 격 닭입니다. 종계가 낳은 알은 부화장을 거쳐 각각 달걀을 낳는 닭이 모인 산란계 농장, 닭고기 생산용으로써의 닭이 모인 육계 농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기용 닭으로써 삶을 마감하는 육계는 부화한 뒤부터 평균 31일간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불어난 뒤 도축됩니다. 📃2018년 영국 왕립 사이언스 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21세기 닭의 몸무게는 1957년 품종의 닭보다 4~5배나 많다고 할 정도예요. 신체적 극한에 이를 때까지 개량되어 온 닭은 짧은 생 내내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다리와 가슴 조직이 급격히 성장해 심장과 폐 기능이 제한되고, 무거운 무게에 다리가 주저앉은 등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인간의 개입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개, 닭, 돼지 농장에서의 경험을 서술한 📙<고기로 태어나서>를 보면 더 참혹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육계 농장에서의 일은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닌 죽이는 것이었다고 해요. 허약하거나 병든 닭을 찾아 비싼 사료를 축내지 못하도록 목을 부러뜨리고, 이미 죽은 닭은 처리하면서 죽음에 대한 감정들이 점점 무감각해졌다고도 고백합니다. 닭고기 생산은 무게와 상태에 따라 값을 쳐주기 때문에, 약한 닭은 도태되는 양계장은 동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제게도 몹시 끔찍했습니다.
② 닭은 달걀을 낳고, 닭은 기계가 되지

달걀은 어떨까요? 우리가 먹는 달걀은 산란계가 낳은 ‘알’입니다. 당연하게도 달걀은 암탉이 낳습니다. 산란농장에서 산란계 수탉은 알을 낳지 못하고, 육계와 달리 맛이 없어, 키워도 사룟값이 안 나오는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수평아리는 컨테이너 벨트 위에서 부화되자마자 마대자루에 버려진 채 깔려죽거나,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잔인하게 죽게 돼요.
살아남은 암탉은 1년 반에서 2년간 매일 한 개 꼴로 알 낳는 기계가 됩니다. 플로리다 동물 권리 재단(ARFF)의 James Wildman은 수정없이 만들어진 닭알(무정란)은 🎬‘닭의 월경 주기 부산물’이라며, 무정란이 인간의 월경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 월 1회 알을 낳기도 어려웠던 닭이 품종 개량을 통해 연 300개 가량의 알을 낳게 된 현상을, 매일 월경하는 것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닭이 알을 만들 때 많은 칼슘이 필요하다 보니 골다공증에 걸리거나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떠한 닭이든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거대한 착취와 학살이 지속되는 겁니다.
닭장은 거대한 공장일 뿐입니다. 한 마리의 닭이 사는 닭장의 크기가 A4 종이만 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사육 환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을 보고 열악한 환경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국내 동물복지 농장이 7%도 안 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산란계 닭장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공책 크기의 철창으로 만들어져 여러 마리의 암탉이 한데 갇혀 삽니다. 산란효율을 높이고자 14시간 이상 조명을 쪼이고, 알이 굴러갈 수 있도록 바닥은 경사져 위태롭게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는 발톱은 뽑히고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며, 한 곳에서 식사, 용변, 산란합니다. 비위생적이고 가혹한 환경에서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서 생기는 상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마취도 없이 부리가 잘리기도 합니다.
③ 기후위기 최전선에 닭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서 닭도 결국은 최전선 당사자입니다. 특히 밀집된 환경에서 폭염이 오면 닭은 땀샘이 없어 몸의 열을 식히지 못하고, 한계에 달해 지친 닭들은 급격히 죽어 나갑니다. 힘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 몸이 익고, 헐떡거리다 폐가 망가지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으로 몰려가다가 깔려서 죽습니다. 가뭄이 오면 닭장에 뿌려 더위를 식힐 물을 구할 수 없고, 집중호우가 오면 닭장이 잠기는 등 도축되지 않더라도 갇혀 있는 닭은 다양한 기후재난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올해, 7월 초까지 전남지역에서 죽은 닭만 1천 600마리였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도 결국은 AI와 같은 전염병에 집단 살처분되는 닭,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죽는 닭과 같이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농장 동물로써 닭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쓰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날 닭은 인간에게 더 저렴하게, 더 많이 공급되기 위해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이윤 창출을 위한 폭력적인 산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닭은 동물이지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닭이라는 동물로 태어났다면 그 수가 얼마든 무척이나 인간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축산 산업의 굴레를, 단 한 마리도 벗어날 수 없다는 참혹한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일상에서는 가려져 있다는 건 뭐라 표현해야 할지 어려울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복날을 전후로 원하든 원치 않든 식탁에 올라오는 닭에 대해 더 많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유독 삼계탕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길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치킨집과, 배달 어플과 각종 레시피 미디어에서 닭다리 이미지와 함께 닭을 파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울렁이는 마음에 괜히 눈을 감고, 조금은 긴장된 채로 지나치기도 합니다. 식품이 아닌 동물로써의 닭을 기리며 다시 복날을 생각해봅니다.
글 | 변인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