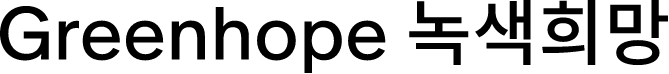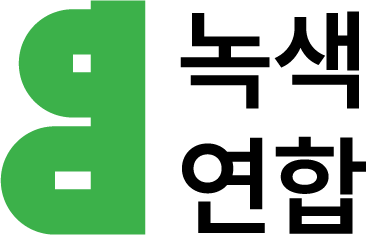1992년 6월 리우회의 이후 30년

냉전의 시대를 지나 비로소 환경을 논의한 국제회의, 리우회의 ©UN Photo/Michos Tzovaras
1980년대까지 세계는 ‘냉전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언제든지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마침내 냉전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계는 전쟁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계의 정상들은 모여서 ‘환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입니다.
리우회의 또는 지구정상회의라고도 하는 이 회의는 전세계 114개 국가 정상과 186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고 각국의 비정부기구도 모여 ‘지구환경회의’를 개최한, 세계최대규모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담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발표되었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태계파괴와 지구 생물종 멸종을 맞기 위한 ‘생물종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 냉전시대를 끝낸 세계가 이제 우리 공동의 지구, 우리 공동의 미래를 돌보자며 낙관과 희망을 갖고 모였을 리우회의의 30년 뒤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P4G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수 차례의 국제회의보다 명확한 목표설정과 실행이 시급하다. ©청와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처음 만들 때 세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381억CO2eqt(이산화탄소환산량톤)이었으나 2019년 기준 세계는 그 양을 훨씬 초과한 574억CO2eqt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 기준 온실가스 5.2%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다 온실가스배출국이었던 미국의 거부와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은 당시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며, 온실가스배출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사이 전세계 온실가스는 줄어들기는 커녕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 앞에선 지구적 결의와 협의가 종이 한 장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걸 리우회의 30년이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사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92년보다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들도 있고 1992년 당시 가장 큰 환경문제였던 오존층파괴는 각국이 프레온 같은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오존층의 구멍이 줄어드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정부는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의나 선언은 구체적인 행동과 집행, 실행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30년 전 리우회의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글 : 정명희 녹색연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