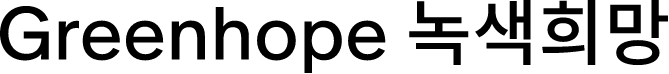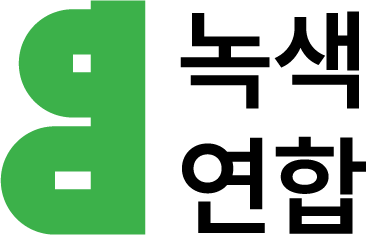후쿠시마는 여전히 2011년 3월 11일이다.

2011년 3월 11일 대형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걱정하던 중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놀라움과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11년이 흘렀다. 해마다 이 날이면 311 사고를 되짚으며 현재의 후쿠시마 모습을 찾는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언제나 같은 내용이다. 후쿠시마는 여전히 그 날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물론 사고 당시 후쿠시마현 주변 50km까지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후쿠시마현의 ‘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주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민들이 돌아왔고 인근 지역은 부훙 지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재원이 투자되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복구의 핵심인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폐로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도 더디기만 하다. 폐로작업을 위해서는 사고 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포함하여 원자로 안이나 원자로를 덮고 있는 격납용기 아래에 쌓인 880톤 가량의 강한 방사성 물질들을 외부로 꺼내야 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로봇을 이용해 원격조정으로 꺼내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몇 그램 정도를 들어 올리는 것이 현재 로봇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또한 이 방사성 물질들을 꺼낸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후쿠시만 현을 포함한 인근의 도시는 모두 현 외로 폐기물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폭발 후 남은 발전소 건물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건물을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후쿠시마의 일부 지역이 반영구적으로 ‘귀환곤란구역’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처리비용에 이미 한화 130조 가량이 쓰였는데, 80%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의 토양을 걷어내는 것 같은 제염과 배상과 관련된 비용이다. 본격적인 폐로비용은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민간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폐로와 오염수 처리에 510조가 든다고 계산하기도 했다.
예측을 벗어난 재난 등으로 핵발전소의 사고는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폐로작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가동 중단 이후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작업에만 보통 3~40년이 걸리고, 방사성 물질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방사성 핵종에 따라 수만 년 이상이 걸리는 핵종도 있다. 사고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핵발전소를 기피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부산처럼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부근에 핵발전소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피난 구역 안에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기도 어렵지만, 피난 구역 밖의 사람들이 가시거리 안에서 폐허가 된 이웃 동네를 보면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대한 해법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 중 핵발전소를 더, 계속 짓고 낡은 발전소도 더 운영하게 하자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과연 해법을 갖고 있을까?
[글 : 정명희 녹색연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