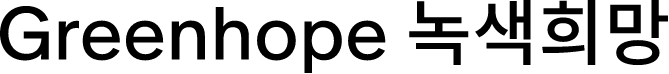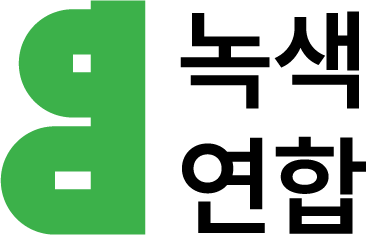1963년 11월 5일 최초의 환경법 ‘공해방지법’ 제정

공해방지법 공포안
60년 전, 1963년 11월 5일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만든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행사하던 시기입니다. 공해방지법 역시 이 위원회가 만든 1162개 법률 중 하나죠.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해’라는 단어는 공해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기·수질·토양·악취 등의 문제를 일컫는 대표적인 단어로 90년대 초반까지 사용되었습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공해방지법’을 두고, 당시 산업화로 공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일본보다 몇 년이나 앞서 제정된 환경법이라고 의미 부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토론이나 전문성 없이 국가재건최고위원회 단독으로 급조해 만든 이 법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두지 않고 법과 관련된 예산도 배정되지 않아, 당시 한 신문 사설은
‘선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제정되자마자 망각된 법률’
이라고 폄하합니다. 국가가 ‘공해’문제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정도가 이 법의 최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1년이 지난 뒤에야 소음, 대기, 악취, 수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법적 제제를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조차 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공해방지법이 산업시설을 희생시킨다는 산업계의 항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공해에 노출된 시민들이 공해방지법을 내세워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965년 3월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을 근거로 마포구 염리동 주민들이 서울시청 보건과에 제일주정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부산에선 감천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25만 명이 발전소 굴뚝의 연기와 그을음에 피해를 보았다고 부산지법에 ‘매연분출방지가처분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 1965년 6월 15일 보건사회부는 공해방지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발전소에 매연집진기설치령을 내립니다. 당시 언론은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 8개월이나 지나서 시민들이 진정해야만 법이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정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던 법을 기어이 작동하게 만든 1960년대의 앞서나간 시민들이 계셔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새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