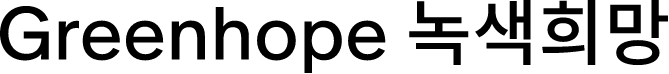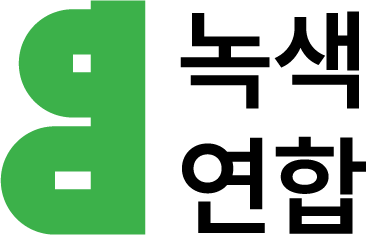ⓒ서울애니멀세이브
고요해지는 시간, 낯선 이들과의 만남
소의 해를 맞아 어느 때보다 많이 거리와 마트에서 소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행복하소 건강하소’라는 슬로건과 함께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케이크 위에서, 치즈 제품 포장지에서, 고깃집 간판에서 환하게 웃는 소의 얼굴들을 보았다. 살아있는 소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한 건 비질 활동에서였다. 고요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된 비질(Vigil)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트럭의 동물들에게 잠깐이나마 물을 주고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여 현실을 알리는 활동으로, 현장의 기록을 공유하는 이들의 강렬한 언어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담겨 있었지만 그 강렬함은 과장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애니멀세이브 활동가는 한 기고 글에서 ‘비질의 목적은 잔인함에 집착하거나 상인을 악마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먼 곳에서 온 ‘낯선’ 얼굴을 마주하며 자본과 이윤에 뒤집힌 공간을 상상할 뿐’이라고 말했다.
몇 달 뒤 나는 화성의 어느 도살장 앞에 도착해있었다. 그 날 나는 정자에 짐을 놓은 후 마음 속으로 트럭에 실려 올 돼지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귀를 파고 들어왔다. 낯설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트럭에 있는 돼지들이 시간 틈을 두며 비명을 질렀고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눈에 눈물이 고여버렸다. 좀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 죽여 듣게 되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좁은 트럭에 빼곡히 끼어 오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지만, 도살장의 피 냄새를 맡고 죽음을 직감해서도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누군가 말했다.
가져온 물통을 챙겨 도로변으로 향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트럭의 돼지들에게 잠깐이나마 물을 주고,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몇 분을 서 있으니 곧이어 트럭 한 채가 들어왔다. 트럭에 가까이 가자 그들의 냄새, 비명소리, 오물을 뒤집어써 얼룩덜룩한 살, 눈동자가 다가왔다. 어떤 돼지들은 다른 돼지의 등 위에 올라타 팔이 꺾여있었고 바깥쪽 돼지들의 모습은 그나마 보였지만 가운데에 깔려있을지도 모르는 돼지들, 2층의 돼지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서둘러 그 모습을 눈에 담다가 옆에 사람들이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물병을 꺼냈다. 물을 뿌리자 몇몇 돼지들은 허겁지겁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고 있겠지? 생각해보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삶을 살아도 도움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껴본 적 없는 채 이들은 음식이 되러 가고 있었다. 왜 도축장이 외곽에 있는지, 왜 도심에서는 살아있는 돼지를 실은 트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알 수 있었다. 중간 중간 소를 실은 트럭도 들어왔다. 소들은 주로 침을 흘리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주저앉아버린 소, 눈물을 흘리는 소, 어디를 다친건지 피를 흘리는 송아지도 있었다. 소는 돼지와 달리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그만의 두려움과 고통은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트럭들은 도살장 앞에서 몇 채씩 밀려 줄을 섰고 동물들은 재촉하는 직원들에 의해 트럭에서 내려졌다. 동물들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곳은 도살장과 연결된 바로 옆 도소매업장이었다. 몇 시간 전 본 동물들이 판매되고 있었고, 도마 위 커다란 소 머리엔 털을 다 밀었어도 남아있는 소의 하얀 수염, 귓가에 남아있는 갈색 털, 이마에 선명한 총의 흉터가 보였다. 산처럼 쌓여있는 돼지머리에 훤히 보이는 하얀 목뼈, 상자 밖으로 넘쳐있는 창자들이 있었고 발밑에는 피가 흥건했다. 잠깐이지만 눈이 마주치고 숨결을 나눈 이들이 생각났을 때 판매대 에 붙여진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포스터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도소매업장 2층에는 갓 나온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 있었고, 문을 열고 나오자 고기를 운송할 준비를 하는 트럭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수백마리의 얼굴들
보통 새끼 돼지는 태어나면 마취 없이 꼬리가 잘린다.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의 꼬리를 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모돈은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틀 안에 살다가 도살되며, 어미 소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인간에게 줄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를 빼앗긴다. 도축장으로 갈 때 처음으로 평생을 살던 곳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은 동족의 피 냄새, 기계 소리, 비명소리가 난무한 도살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비질 활동이 끝나고 정자에 모여서 서로가 보고 느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축’이라 명명되는 이들의 현실을 맞닥뜨리고 이를 언어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나는 말을 고르다 끝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 도살장 앞에서 마주했던 이들의 생명의 무게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그 날 아침 몇 시간 동안 본 수백 마리의 얼굴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심에는, 우리의 식탁에는 그 날 마주한 고통과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의 음식이 한때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연결성’이 철저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애니멀세이브
생명으로 돌아가기
소의 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비인간동물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도살된 소, 돼지, 닭, 오리는 11억 5,600만 마리를 넘는다.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다. 만약 축산업이 기후와 지구 환경에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축산업이 이대로 유지돼도 괜찮은 걸까? ‘가축’이라 일컬어지는 동물들을 ‘탄소’로 등식화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건 없을까? 기후생태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삶을 전환하지 않은 채 우리는 과연 전 지구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모든 문제를 ‘탄소’로만 바라보는 탄소환원주의에서 나아가 식탁 위의 동물들이 한 때 ‘생명’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차가운 외면이 담긴 인간 중심적인 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선순환’ 축산업을 위해 소들이 메탄을 덜 발생시키도록 곡물과 해초를 넣은 고급 사료를 개발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번식 관리를 하자는, 단지 뭔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산업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대안 말이다. 지금은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를 규제하고 감축할 때이지 동물을 탄소로 등식화할 때가 아니다. 동물들의 삶을 마주한다면 축산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업’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비인간동물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닌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후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잊혀진 삶을 기억하고 왜곡된 관계를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참고1 : 섬나리, “노는 물’이 달라 죽어간 그들… 수산시장에서의 애도”, <애니멀피플>, 2021.05.21
참고2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lpsms.go.kr/home/stats/stats.do?statsFlag=butcheryperiod
글 : 진채현 녹색이음팀 활동가